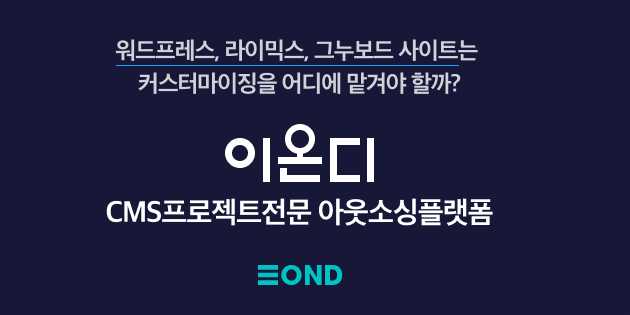어느 때부터인지 나는 메모에 집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는 잠시라도 이 메모를 버리고는 살 수 없는, 실로 한 메모광(狂)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버릇이 차차 심해 감에 따라, 나는 내 기억력까지를 의심할 만큼 뇌수의 일부분을 메모지로 가득 찬 포켓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수첩도, 일정한 메모 용지(用紙)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 종이이거나 ―원고지도 좋고, 공책의 여백도 가릴 바 아니다.― 닥치는 대로 메모가 되어, 안팎으로, 상하 종횡 (上下縱橫)으로 쓰고 지워서, 일변 닳고 해지는 동안에 정리를 당하고 마는지라, 만일 수첩을 메모지와 겸용한다면, 한 달이 못 가서 잉크 투성이로 변할 것이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을 때, 흔히 내 머리에 떠오르는 즉흥적인 시문(詩文), 밝은 날에 실천하고 싶은 이상안(理想案)의 가지가지, 나는 이런 것들을 망각의 세계로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 머리맡에는 원고지와 연필이 상비되어 있어, 간단한 것이면 어둠 속에서도 능히 적어 둘 수가 있다.
가령, 수건과 비누를 들고 목욕탕을 나서다가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나는 이것을 잊을까 두려워, 오직 그 생각 하나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나, 거기서 연상(聯想)의 가지가 돋치는 다른 생각 때문에, 기록할 때까지 기억해 두 지 않으면 안 될 수효가 늘어, 점점 복잡하게 된다든지, 또는 큰길을 건널 때 자동차를 피하다가, 혹은 친구를 만나 인사와 이야기하는 얼마 동안, 깨끗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생각났던 것을 생각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지 못할 때의 괴로움과 안타까움은 거의 나를 미치기 직전에까지 몰아가곤 한다. 그러므로 목욕이나 이발 시간같이, 명상의 시간이 주어지면서도 연필과 종이가 허락되지 않는 때처럼, 나 같은 메모광에게 있어서 부자유한 시간은 없는 것이다.
꿈에서 현실로 넘어서는 동안, 고개 안팎에서 얻은 실로 좋고 아름다운 상(想)을, 나는 머리맡에 놓인 종이에 곧 의뢰하건만 ― 바쁜 행보 중(行步中), 혹은 약간의 취중에 기록한 메모의 글자나 그 개념(槪念)이 불충분할 때가 간혹 있다. 그런 메모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모색하는 고통은 여간한 것이 아니다. 마치, 예의 있는 석상에서 상대방의 불쾌를 우려하여, 기자풍(記者風)의 괴벽(怪癖)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통과 비견(比肩)할 만도 하다. 그래, 그 분명하지 못한 자신의 필적을 응시 숙려(凝視熟慮)해 보건만, 결국 신통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적지 아니하다. 연상(聯想)의 두절(杜絶)로 인한 무의미한 자획이 한동안 내 머릿속을 산란하게 해 주었을 따름이요, 그렇다고, 별반 큰 변동이 나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은 전연 아니다.
아침마다 나는 그 메모를 대략 살펴, 그 날의 행사를 발췌 초록(拔萃抄綠)해 들고 집을 나서건만, 물론 실행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기회 있는 대로 정리하고 정리하는 메모, 여기저기 기이한 잉크 흔적을 보여 주는 몇 장의 메모일지라도 나는 그냥 봉투 속에 집어넣고 간수한다. 그것은 고액(高額)의 지폐에 비길 바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분실한 일이 없었다.
메모뿐이 아니요, 평소에 별로 소유물을 잃어버려 본 일이 없는지라, 성냥 한 갑이라도 이유 없이 어디다 놓고 온 때에는, 불쾌한 마음이 한 동안 계속되는 괴벽임에도 불구하고, 일대 사건 ― 내게 있어서는 실로 중대한 사건 ― 이 발생한 일이 있다.
이미 오래 된 일이지만, 나의 학창 시절에 자취하는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 저녁을 먹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서 메모를 정리하려고 포켓을 뒤졌으나, 내 노력은 헛것이었다. 이 날 밤, 잠들기 전의 일과는 상궤(常軌)를 벗어나, 내 마음을 진정시킬 길이 없었다. 찾고 또 찾고, 생각다 못해 기차로 두 정거장이나 가서도 십 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친구의 집을 그 길로 다시 되짚어 찾아갔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쓰레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었다. 변소로 가는 마루에서 내 귀중한 메모 봉투를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이란! 아직도 어렸을 적이라, 환호작약(歡呼雀躍)하여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고 가라는 권유도 한 귀로 흘리고, 단걸음에 숙소로 돌아왔다. 물론, 그 날 밤은 평소에 드문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의 메모광적인 버릇은 나의 정리벽(整理癖)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적(書籍)이며, 서신(書信)이며, 사진이며, 신문, 서류 등의 정리벽은 놀랄 만큼 병적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원고를 끝내지 못하고서는, 다른 새로운 일에 착수하지를 못한다. 독서에 있어서도 또한 다분히 그런 폐단이 있는 까닭에, 책상 위에 4,5종 이상의 서적을 벌여 놓는 일이 별로 없으며, 책의 페이지를 펼쳐 놓은 채 외출하는 일도 전혀 없다.
또, 수집벽(蒐集癖)도 약간 있어, 내 원고를 발표한 신문, 잡지들은 물론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랩하고, 소용에 닿을 만한 다른 신문, 잡지도 가위와 송곳을 요한 후, 벽장 속에 쌓아 두는 것이다.
요컨대, 내 메모는 내 물심 양면(物心兩面)의 전진하는 발자취며, 소멸해 가는 전 생애의 설계도(設計圖)이다. 여기엔 기록되지 않는 어구(語句)의 종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한 것이니, 말하자면 내 메모는 나를 위주로 한 보잘 것 없는 인생 생활의 축도(縮圖)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쇠퇴해 가는 기억력을 보좌하기 위하여, 나는 뇌수의 분실(分室)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